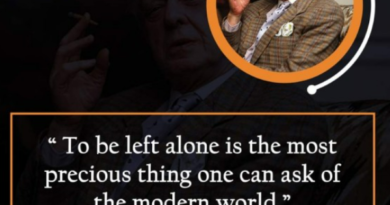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평론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사람같이,
세상 저항력이 없는 사람.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원망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사람.
너무 가벼워 훅 불기만 해도
금새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혼이 빠져 나간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남기기 위해 자화상을 그렸다고 한다.
얼굴이 없는 사나이는 자신의 영혼을 그린다.
영혼마저 잔 털에 가려 있는 사람.
마치 원숭이 영혼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렸다.
플로방스, 막 어둠이 나리기 시작하는 때, 높은 하늘에서 소나기 같이 나리는 해맑은 햇살은 마다하고,
귀를 스치는 적막한 바람 소리에 더 예민해 하고 있다.
마치 자신의 죽을 영정에 바칠 그림을 그린 듯, 삶에 대한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
영혼이 빠져 나간 육신을 조롱이나 하듯 무표정하기만 하다.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른 뒤,
이제 온 몸을 자르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듯, 붓의 움직임에 살기가 느껴진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밀밭, 육신을 내팽게 쳤지만,
심장을 꿔뚫지 못한 어슬픈 육신은 또 다시 그를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 머물게 하다.
유일한 세상 동반자였던 동생 테오 옆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난다.
이 땅에서의 그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잠시 머물다 간 의미없이 스쳐 자나간 바람이었을까?
아니면, 그토록 홀로 남겨져서, 세상 십자가 형벌을 마다 않고 감당하고 간 그 무언의 구도자였던가?
♡ 안응 곽계달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멍한표정?” – 정영숙님 –
자기가 육신으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표정이 아닌까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도 갈 길을 예약하지 못한 사람의 황량한 얼굴이지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 갈등하는 한 인간의 존엄한 얼굴이기도 하지요.
오늘 아침 조간에서 사람(육)과 제우스 신(영)을 속인 죄로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지만 정상에 다다르면,
또다시 굴러 떨어지는 끝없는 형벌을 받게 되는 교활한 코린토스의 왕, 시시포스에 대한 신화를 보았지요.
고흐는 마치 시시포스왕과 같이 육과 영, 둘 다 희망을 버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재미나는 추론도 해 본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도 없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감당하지 못한 채, 멋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다. 이런사람이 제정신을 찾아더라면 그많은 작품을 남길수 없지않을까? 그가 떠난후 그의 천재성을 알게 되며 돈푼께나 있는 부자들이 그림을 사려고 야단들이었다. 그의 그림은 시골 농가 풍경, 서민들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뭉클하니 애정이 간다. 마지막 숨을 거둘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였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 Jinpark Rhee –
“흐릿한 찌푸린 날씨와 잘 어울리는 고흐에 대한 다시 보기였습니다.
밀밭에 육신을 내팽겨 칠 때의 인간의 모습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 Shinok Choi –
“‘까마기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이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되었지요. 그 작품을 그린 밀밭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 권총 자살을 시도 했지만, 총알이 심장에서 빗나가는 바람에 결국은 집까지 돌아 와서 동생 테오 옆에서 숨진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