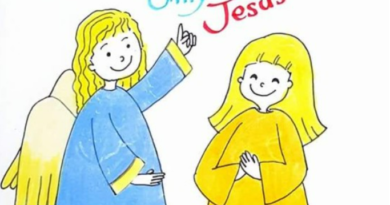“가르친다”는 무거운 주제?
100% 공감을 전합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설 쓰기 고백을 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는가?
다만, 평생, 인생이라는 주제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또 곱씹는 것들의 하챦은 반복들이 모여 차고 넘친 문학적 철학적 사유들이 콘텐츠화(체화(embodiment)된 경륜의 내용들)하여 자연스레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 창작 작업이 아닌가 합니다.
“가르친다”라기 보다는 만남과 소통 그리고 경험을 나누고 인생을 서로 공유한다는 의미로 다가선다는 열린 마음에 중점을 둔다면 가르친다는 숙제가 축제로 승화되어 아름다운 만남의 희열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원웨이(one-way)로 가르치기 보다는 이야기와 대화의 수단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답변(댓글)하는 식의 실시간 투웨이(two-way), 즉 살아움직이는 양방향 소통(플라톤의 대화론이나 즉문즉답을 통한 법륜스님의 진행스타일, 예수와 부처와 공자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가르침)방법을 가르침의 수단으로 진행하신다면 한결 좋은 결과를 얻으실겁니다.
당연히 작가들은 독자들과는 문학소설로도 직접 만나시겠지만 대중들과 person to person 으로 눈으로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장소를 점차로 늘린다면 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작가님의 승화된 배움의 통로를 지나시게 될겁니다.
폭넓은 정반합의 이름다운 열매를 미리 축복드립니다.
♡도천 곽계달♡
ㅡㅡㅡㅡㅡ
“여행 후 닷새만에 메일함을 열었다.
낯선 메일이 있었다.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열었다.
출판사에서 내 메일 주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모 백화점 문화센터로부터 내년에 소설 쓰기
강좌를 신설하므로 청빙하고 싶다는 메일이었다.
오래 고민할 여지없이 답장을 보냈다.
정중하게 거절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소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배우지 않았기에.
글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건방진 소리를 하고 싶지 않다. 글쓰기에 정석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내 방식만 알 따름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쓰고 싶은 걸 쓰고, 떠오르면 쓰고, 깊이 생각했다가 끄집어내고, 고치고 또 고치고 다시 고쳐가는 과정에서 글이 다듬어질 뿐이다. 그리고 아무리 고쳐도 또 고칠 게 나온다는 걸 알뿐이다.
배워서 쓸 수 있는 시나 소설이라면 좋겠지만,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한 뒤 작가가 된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전업작가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배고픈지 알지 못한 채 덤볐다간 시작도 못해보고 나가떨어질 사람 수두룩하다. 누군가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이왕이면 배고픔을 극복하는 법도 가르치는 게 어떨까.
사람이 가진 그늘을 이해하고, 그늘에 가려진 또 다른 그림자를 찾아내는 일, 그것이 나에게 소설을 쓰게 하는 힘이다.
나는 나만의 글쓰기 방식이 있고, 글과 문장에 습관이 있다. 그것을 독자는 알아차릴 것이다. 내 글을 읽고 이것은 구소은의 문장이라고 발견해 주는 독자들이 있다. 그러면 충분하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무척 조심스럽고, 어떤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용돈 좀 벌자고, 억지로 의미를 불어넣어가며 섣불리 수락할 수 없는 일이다. 실력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부추기는 짓은 죽어도 못하겠다. 돈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겠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글쓰기에 대해 묻는다면, 해줄 수 있는 말이 몇 가지 있다. 내가 왜 썼고, 왜 쓸 것이며, 무엇을 쓸 것인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쓸 것인지를…. 그게 전부다.
거의 날마다 교정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내가 완성한 <종이비행기> 원고를 몇 페이지씩 다시 본다. 오타나 띄어쓰기에서 오류를 발견한 건 별로 없다. 단, 독자가 읽었을 때 멈추지 않고 술술 읽을 수 있도록 윤문에 힘을 더 써야 하는 걸 깨달았다.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가야 하는 길이기에 오늘도 나는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 창작의 고통 뒤에 값진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아니까!”
-구소은님-